언론자료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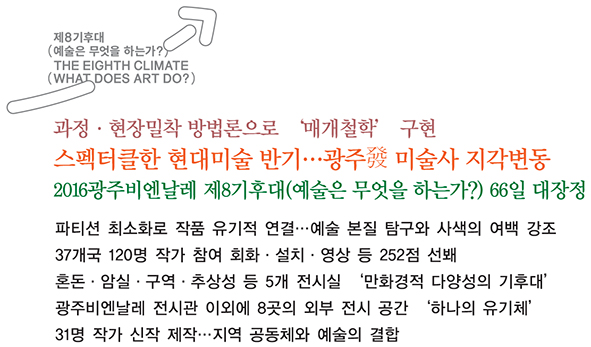
37 개국 101작가(120명)가 참여해 252점을 선보이는 2016광주비엔날레는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THE EIGHTH CLIMATE(WHAT DOES ART DO?))’를 타이틀 삼아 예술의 역할인 ‘사회와의 매개성’(媒介性·Mediation) 철학에 입각하여 여타 비엔날레와 차별화된 1년 6개월 간의 과정과 현장 중심의 방법론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참여작가의 25%가 현지에서 지역 공동체와의 협업 및 역사성에 주목해 신작을 제작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본전시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이외에 8곳의 외부 전시장을 활용하면서 예술과 시민사회의 접점을 넓힌 것 또한 ‘매개철학’(媒介·Mediation)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의재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우제길미술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두암 2동 누리봄 커뮤니티센터, 일곡동 한새봉 두레, 서구문화센터 앞 전광판 등 전시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면서 광주 시내 곳곳이 현대미술의 장으로 연출되었다. 이와 함께 광주 도심 재생 프로젝트인 광주폴리에서 2013년 선보였던 광주역 인근 에얄 와이즈만(Eyal Weizman)의 ‘혁명의 교차로’가 이번 광주비엔날레 외부 전시 공간에 합류됐다. 이러한 외부 전시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완성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 전시는 스펙터클하고 과도한 이미지로 뒤덮인 현대미술에 대한 제동으로서 동시대 현대미술의 역할을 사색과 본질에 두고 기획한 만큼, 전시공간에 관람객들의 참여와 사유의 공간인 여백을 의도적으로 두고 있다. 파티션을 최소화하고 작품과 작품 사이의 여백을 활용해 동시대 예술의 본질과 삶 속에서의 예술적 개입을 실천하고자 했다.
즉, 2016광주비엔날레는 ‘매개철학’(媒介·Mediation) 실행 방식으로 지역 협업 및 교육 프로젝트인 ‘월례회’(Monthly Gathering), ‘인프라스쿨’(Infra-school), ‘2016 광주비엔날레 포럼’(2016 Gwangju Biennale Forum) 등의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과정과 현장 중심의 ‘미학적 프레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광주비엔날레는 물론 다른 세계 각국의 비엔날레와 차별점을 두면서 전시 자체의 ‘무게’를 빼고 비움과 사색의 공간 형성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 여백의 미, 사색의 공간…“예술의 본질을 사유하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외부 전시 공간 8곳에서 보여지는 결과물은 1년 6개월 간의 오랜 과정과 협업에서 나온 것으로 동시대 예술의 본질을 깊게 탐구한다.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THE EIGHTH CLIMATE(WHAT DOES ART DO?))’라는 타이틀 아래 전체 전시를 관통하는 7가지 가닥을 제시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사유와 사색의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와 사색의 장치로 전시관의 파티션을 없앴고, 시각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 설치 작품이 아닌 역사성과 현장성, 동시대 현안 등의 예술적 철학과 미학이 녹아든 작품들로 구성하면서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광주비엔날레는 마리아 린드(Maria Lind) 예술감독을 비롯해 최빛나(Binna Choi)큐레이터, 마르가리다 멘데스(Margarida Mendes), 아자 마모우디언(Azar Mahmoudian), 미쉘 웡(Michelle Wong) 보조 큐레이터로 구성된 큐레이터팀과 미테-우그로 지역협력 큐레이터가 참여해 예술 및 관련 교육, 담론 중심의 매개 프로젝트를 1년 6개월 동안 실행해오면서 7가지 전시로 구현될 가닥을 추려냈다.
▲ ‘땅 위와 땅 밑’(Above and Below Ground) : 땅과 천연자원으로 대변되는 지구 생태계와 이에 대한 문화인류학, 사회정치학적 고찰 ▲ 노동의 관점에서 (The Labor Point of View): 변화하는 작업조건이 일상의 삶과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과 작가적 개입 ▲분자와 우주 사이 (Between Molecules and Cosmos): 우주를 움직이는 분자의 역할과 기능
▲ 새로운 주체성들 (New Subjectivities): 사회 주류 문화에 도전하는 타자적 존재와 주체성에 대한 근본적 조명 ▲ 반항에 대해 (Defiance): 사회의 수직적 구조에 도전하는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유영방식 ▲ 불투명할 권리 (Right to Opacity): 동시대미술에서 보여지는 형식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들이 추상화되는 경향들에 대한 예술적 전략 ▲ 이미지의 사람들 (Image People): 이미지 범람의 시대, 새로운 권력의 도구가 된 이미지의 의미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 등의 7가지 가닥은 전시를 읽는 ‘코드’로 작용한다.
● 베일 벗은 ‘제8기후대’…과거·현재·미래의 혼재 ‘만화경적 다양성의 기후대’
2016광주비엔날레 타이틀 ‘제8기후대’는 12세기 페르시아 신비주의자이자 철학자인 소흐라바르디(Sohravardi)에 의해 착안되고,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앙리 코르뱅(Henri Corbin)에 의해 다듬어진 개념이다. ‘제8기후대’는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들이 찾아낸 지구상 일곱 개의 물리적 기후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상상적 지식과 기능의 개념 즉 ‘상상의 세계’(the imaginal world)라 할 수 있다.
이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예술을 통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출품작들을 여러 지대로 묶으며 다양한 기후대를 오감으로 체험하게 했다. 즉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내 5개 전시실은 온도와 밀도, 분위기 등의 기후 환경이 제각각 다르게 조성되면서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각 전시공간의 지대들이 창출해내는 환경들은 우리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 및 다중성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제 1전시실은 41명의 작가들이 다양한 장르 작품들을 밀집시켜 높은 밀도를 연출하면서 만화경적인 풍경과 ‘카오스’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입구에 들어서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주요 거점이자 토론의 장이었던 녹두서점을 재현한 도라 가르시아(Dora Garcia)의 신작 ‘녹두서점-산 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을 만날 수 있다. 1977년 계림동에 처음 문을 열었던 녹두서점은 36년 전인 1980년 5·18 당시 격문과 투사회보 등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곳이다. 광주출신인 박인선(Insun Park)의 작품 ‘뿌리’는 광주의 재개발 지역을 작품 소재로 하면서 지난 시대의 가치를 되새겨보게 한다.
제 2전시실에 들어서면 조명을 사용하지 않은 어두운 공간 즉 ‘암실’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가벽 설치를 최소화하면서 비디오, 프로젝션 등 영상작품만 배치해 공간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2015베니스비엔날레 참여작가이자 현대자동차가 영국의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Tate Modern)’과 진행하는 ‘현대 커미션(Hyundai Commission)’ 작가로 선정된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의 드로잉을 LED 조명과 사운드를 통해 발전시킨 작품 ‘삶에 존재하는 힘을 넘어설 수 있는 율동적 본능을 가지고’가 설치됐으며, 2013년 에르메스 미술상을 수상했던 정은영(siren eun young jung)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통념화된 여성의 성적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동의 막’ 등이 선보인다.
제 3전시실은 작품마다 독립적 ‘영역(zone)’을 만들면서 가벽이 없는 열린 공간을 연출한다. 각각의 작품이 벽이자 하나의 공간이 되는 셈이다. 사회·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리서치 기반의 프로젝트를 해온 나타샤 사드르 하기기안(Natascha Sadr Haghighian)가 어린이용 장난감(LEGO)으로 독일 군용 탱크의 기판을 실사이즈로 재현한 사운드 설치 작품 ‘Passt Leopard 2A7+’이 전시되며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인 미하엘 보이틀러(Michael Beutler)가 광주에 머물며 지역학생들과 함께 작업했던 ‘대인 소시지 가게’를 만날 수 있다. 대인시장에서 과일 담는 망과 종이를 활용해 제작한 ‘종이 소시지’가 벽돌처럼 쌓이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제 4전시실은 동시대 미술에서 보여 지는 추상성에 부응하는 작품들이 배치됐다. 테헤란에서 활동하는 작가인 모니르 샤루디 팔만팔마이언(Monir Shahroudy Farmanfarmaian)의 작품은 섬세한 공예 기술과 표면 질감, 빛과 반사, 색상 및 형태 등의 상호작용을 현대적 추상에 적용시킨 작품이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타일러 코번(Tyler Coburn)의 작품 ‘인체공학의 미래’는 상상 속의 미래 인류를 위해 디자인된 인체 공학적인 가구 시리즈이다.
제 5전시실에는 성과 페미니즘 논의에 기반한 여성 퀴어 문화를 주요 주제로 다뤄온 스위스 출신 폴린 부드리(Pauline Boudry)와 독일 작가 레나테 로렌스(Renate Lorenz)로 구성된 여성 아티스트 듀오의 3개의 영상과 LED 조명이 중앙에 설치된다.
이밖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벽에는 디지털 시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온 시각예술 분야 2인 그룹 메타헤이븐(Metahaven)의 가로 29m, 세로 16m의 대형 배너 작품인 ‘정보의 하늘’이 설치됐으며, 광주비엔날레 사무동인 제문헌 1층에도 서울과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주요 작가와 정지현 작가의 협업 작품인 ‘도운 브레익스’(Dawn Breaks)가 선보인다. 아제르바이잔 출신으로 파리에서 활동하는 바비 바달로프(Babi Badalov)의 작품으로 사회·정치적 단상들이 여러 언어로 문구화된 ‘카-펫-탈리즘(Car-Pet-Alism)’이 제 3전시실과 제 4전시실로 올라가는 통로에 설치되면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 37개국 101작가/팀(120명)…스타작가와 신진작가의 다양한 스펙트럼
2016광주비엔날레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는 국제 미술계의 스타작가에서부터 광주비엔날레에 처음 참여한 신진작가까지 현대미술의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영상, 설치, 평면,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매체를 망라한 실험적이면서 참신한 현대미술의 장이 연출됐다. 권역별로 보면 유럽 18개국에서는 44작가, 아시아 11개국에서는 32작가, 북미 3개국에서는 16작가, 남미 2개국에서는 4작가, 오세아니아 1개국에서 2작가, 아프리카 2개국 3작가가 참여한다.
2011베니스비엔날레 스페인관 참여작가이자 2010상파울로비엔날레 참여작가인 도라 가르시아(Dora Garcia), 2015베니스비엔날레를 비롯해 뉴욕 모마 및 파리 퐁피두 센터 등에서 전시를 가졌던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 세계적인 예술 매체인 이플럭스 대표 안톤 비도클(Anton Vidokle), 2003베니스비엔날레와 2012카셀도큐멘타 참여작가 왈리드 라드(Walid Raad), 독일 대표적인 작가인 미하엘 보이틀러(Michael Beutler), 2015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 참여작가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2003베니스비엔날레 및 2012카셀도큐멘타 참여작가 나타샤 사드르 하기기안(Natascha Sadr Haghighian) 등 국제 현대미술계에서 내로라하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신진작가들의 참여도 확대되면서 국제 미술계에서 두각을 드러낼 유망 작가 발굴의 장이 됐다.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에이메이 시토 레이마(Aimée Zito Lema), 리스본에서 활동하는 디오고 이반젤리스타(Diogo Evangelista), 한국의 미디어 영상 작가 전소정(Sojung Jun), 광주 출신인 박인선(Insun Park)과 김설아(Seola Kim) 등의 작가들이 국제무대에 등장하면서 광주비엔날레가 ‘신예 작가 발굴’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밖에 국내 작가로는 2013년 에르메스 미술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여성 작가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정은영(siren eun young jung)과 옥인 콜렉티브의 멤버 이정민(Joungmin Yi), 박보나(Bona Park), 차재민(Jeamin Cha), 이주요와 정지현(Jewyo Rhii with Jihyun Jung), 강서경(Suki Seokyeing Kang) 작가를 비롯해 (재)광주비엔날레가 지역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 프로그램’에서 최종 선정된 설 박(Sul Park), 김용철(Yongchul kim) 작가가 참여한다.
● “지역 공동체(community)와 예술의 밀착” 31명 작가 신작 제작
2016광주비엔날레는 지난해부터 작가들이 광주를 방문하면서 현지 주민들과 지역 밀착형 현장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물을 전시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31명의 세계적인 작가들이 현지에서 광주의 생태와 소극장, 도시 환경, 역사 등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커뮤니티와 예술의 결합 과정을 전시에 녹여냈다.
2012카셀도큐멘타 등에 참여했고 마드리드와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리(Fernando Garcia-Dory)는 국내 소극장 운동의 형태와 정치적 계보를 오늘날의 사회·생태학적 투쟁과 도시 개발 모델과 연계 지으면서 광주라는 도시 내 생태계의 흐름과 환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연극 ‘도롱뇽의 비탄’을 선보인다.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리는 지난 4월 자연 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 공동 경작을 하는 일곡동 내 비영리민간단체인 한새봉 두레를 방문했으며 주민 참여형 연극인 ‘도롱뇽의 비탄’을 제작했다. 광주비엔날레 개막 직후인 9월 3일과 4일 이틀 간 두 차례 일곡동 한새봉 두레 자락에서 ‘도롱뇽의 비탄’을 공연한다.
도시계획, 환경주의, 행동주의 그리고 학문 사이를 오가는 아폴로니아 슈시테르쉬치(Apolonija Šušterši?)와 배다리 작가는 주말 텃밭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누리봄커뮤니티센터와 협업 프로젝트인 20분 분량 영상작 ‘도시계획, 두암동’을 선보인다. 이를 위해 작가는 지난 4월 지역 공동체 협업 예술 워크숍 ‘두암동 교실’을 3차례 진행한 바 있다. ‘도시계획, 두암동’ 은 개발자 중심의 도시 개발에 질문을 던지며 지역 주민과 함께 친환경 매체들을 활용해 도시 개발을 직접 해보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로 전시 기간 동안 누리봄커뮤니티센터에서 감상 가능하다.
2016광주비엔날레 외부 전시공간인 우제길 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의재미술관에출품된 작품들은 모두 현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사스키아 누어 판 임호프(Saskia Noor Van Imhoff)는 무등산 자락 우제길 미술관에서 작품 ‘# +26.00’을 선보이며, 뉘른베르크와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베른 크라우스(Bernd Krauss)는 광주 시민과 등산객, 여행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이름없는 정원’을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제작했다. 스톡홀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닐라 클링버그(Gunilla Klingberg)는 현지 밀착 작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광주 무등산을 답사하고 한국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이 작품 활동 했던 춘설헌에서 숙박을 하면서 한국의 풍수지리와 오행, 산 등을 연계해 작품화한 결과물인 ‘고요함이 쌓이면 움직임이 생긴다’를 의재미술관에서 전시한다.
광주의 정체성과 역사에 주목한 작가들도 다수 눈에 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더그 애쉬포드(Doug Ashford)는 지난 5월 광주와 서울을 방문하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열망의 장소를 앵글에 담은 ‘민주주의의 움직임이 있었던 한국의 장소들에 그림을 들고 가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네 개의 예시들’을 출품했으며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윤(Yun Hu)은 광주민주화운동 답사 차 지난 5월 광주를 방문했으며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광주비엔날레의 역사 연구에 기반한 설치작업인 ‘대기실’을 선보인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들의 모임인 오월 어머니집을 수차례 방문한 빅 반 데 폴(Bik van der Pol)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소통과 만남의 공간에 대한 영감을 작품으로 발전시킨 설치작품 ‘직선은 어떤 느낌일까?’를 전시한다. 바르셀로나 출신 도라 가르시아(Dora Garcia)는 36년 전인 1980년 5·18 당시 격문과 투사회보 등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녹두서점에 주목해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녹두서점─산 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을 내놓았다.
● 1년 6개월 간 과정과 협업의 ‘미학적 프레임’
2016광주비엔날레 ‘제8기후대’는 예술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변화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에 대한 탐구이자 기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큐레이터팀과 작가,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가 1년 6개월 간 지속되었다. 즉 광주비엔날레나 다른 비엔날레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과정 중심(process centered)의 방식이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마리아 린드 예술감독과 큐레이터 최빛나, 보조 큐레이터 마르가리다 멘데스, 아자 마모우디언, 미쉘 웡과 함께 큐레이터팀을 구성하고, 광주 작가 및 큐레이터 집단인 미테-우그로를 지역협력 큐레이터로 선정하여 입체적이고 지역 협력적인 제 11회 광주비엔날레의 기반을 다졌다.
과정과 협업을 위해 지난 1월 시범 프로젝트를 거쳐 매달 지역 밀착 프로그램인 ‘월례회’(Monthly Gathering)와 ‘인프라스쿨(Infra-school)’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큐레이터팀과 지역협력 큐레이터 미테-우그로가 공동기획한 지역밀착 프로그램인 ‘월례회’는 1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매달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대인예술시장 내 미테-우그로를 주요 거점으로 양림동, 광주천등 광주 곳곳에서 참여작가, 미술전공 학생, 일반시민 등 30~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월례회의 세부 프로그램은 ‘미테-우그로 예술서가’(The Mite-Ugro Art Book Collection), ‘독서모임’(Group Reading), ‘작가스크리닝’(Artist Screening), ‘작품포커스’(The Art Work in Focus), ‘광주걷기’(Curated Walk) 등 5개로 구성됐다.
9월의 월례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마련되며 폴린 부드리 & 레나테 로렌스의 작가 스크리닝과 김설아 작가 작품 포커스, 도라 가르시아의 프로젝트인 녹두서점 독서모임 등이 예정됐으며, 10월에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영국의 오톨리스 그룹(Otolith Group) 작가 스크리닝, 박인선 작가 작품 포커스, 더 북소사이어티와 함께 하는 독서모임 등이 예정됐다.
예술의 교육적 실천이자 매개 플랫폼인 ‘인프라스쿨’ 또한 지난 1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광주 및 여러 도시, 대안예술학교와 연계한 프로젝트로 교육기반 담론 플랫폼을 시도하고, 광주비엔날레를 예술·교육기관들의 인프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프라스쿨은 2016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작품 발표와 큐레이터의 강의, 프레젠테이션, 그룹 토의와 세미나, 컨퍼런스, 콜로키움, 심포지엄 등으로 구성됐으며 11월까지 총 51개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9월의 인프라스쿨은 오는 9일 동덕여대에서 정은영 참여작가와 24일 ‘RAT School of ART’에서 베른 크라우스 참여작가의 발표가 있으며, 10월 28일에는 마리아 린드감독과 강수미 동덕여대 교수의 전시 투어가 예정됐다. 마지막인 11월의 인프라스쿨은 1일 서울대 워크숍과 4~6일 인터 아시아 스쿨의 전시투어와 인터-아시아 비엔날레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인프라스쿨 협력학교는 서울기반 독립예술학교로 국내외 작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평론 및 강연 등의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기관인 ‘RAT School of ART’, 홍익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예술교육기관 ‘더 뉴센터’(The New Centre), 아시아권 비엔날레를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인터-아시아 비엔날레 포럼을 기획하는 기관인 ‘인터-아시아 스쿨’(Inter-Asia School)을 비롯해 광주에서는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 광주국제교류센터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2016광주비엔날레 프레스오픈 관련 모든 보도자료 및 이미지 등은 광주비엔날레 웹하드(http://www.webhard.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이디 : biennalepress / 비번 : press / 내리기 전용 폴더 / 문의 홍보마케팅부 조사라 / (062)608-4224